|
구미의 근대교육4–문맹퇴치, 무산아동 교육
-소설가 정완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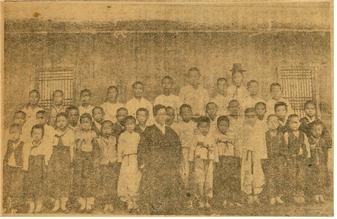
|
|
|
↑↑ (도개야학 생도와 교원. 자료:중외일보)
|
|
전통적인 향촌 기초교육기관은 서당이었다. 훈장의 생계는 학부형들이 봄, 가을로 곡식을 보내 유지했고 교수과목은 『동몽선습』, 『명심보감』, 『사서오경』 등이었다. 설립이 자유로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글자를 가르쳤지만 1918년 일제의 「서당규칙」 공포로 숫자가 현저히 줄었다. 이 조치는 서당 개설의 허가, 총독부 편찬 교과서 사용, 도 장관의 폐쇄·변경 등 조치 가능 때문에 전근대 교육기관은 사라지는 대신 새로운 교육 방식이 시도됐다.
서당은 1920년대를 기점으로 사립학교, 공립보통학교, 강습소나 야학으로 대치되었다.
선각자들이 설립한 사립학교가 1920년대에 들면서 면 단위 공립학교로 흡수되었지만, 교육기회는 많지 않았다. 면 소재지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학교에 갈 수 있었지만, 거리가 먼 마을의 아이들은 십 리, 이십 리를 걸어야 했기에 열 살이나 돼서야 학교에 가는 경우도 흔했다. 때문에 학교가 멀거나 가난한 아동들은 야학을 통해 문맹을 벗어나야 했다.
1925년 가을에 구미면 송정동에서 박희남(朴喜男). 이이기(李爾基) 외 여러 사람의 발기로 송정노동학원을 설립하고 유경렬, 정연덕 두 사람이 무보수로 열심히 가르쳤다. 그 후부터는 박숙용, 이종하(李鍾夏), 이명재(李明宰) 등의 열성으로 가난한 아동 50여 명을 모집해 밤마다 3시간씩 가르쳤다.
산동면을 제외하고는 1930년에 ‘1면1교’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1928년부터 시작된 가뭄은 1929년에는 삼남지방에 유례없는 가뭄을 몰고 왔다. 특히 선산은 가뭄으로 유명한 고장이라 1929년 4월에 되자 이미 군내 전체 3천7백여 호, 1만5천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즉시 구제해야 목숨을 건질 인구만도 9백여 호, 4천5백여 명이 됐다. 행정기관이 구제사업에 나서고 전 군민이 일치단결하여 서로 도우려고 쌀과 돈을 갹출했다.
먹고 살길이 없자 수업료를 못 낸 학생들이 학창을 떠났다. 임금을 살포해 기아를 구제하려고 국고를 풀어 사방공사를 하자 하루 3, 40전의 임금을 벌려고 많은 아이들이 공사장으로 나갔다.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려고 1929년 6월 14일 정오에는 군수가 비봉산 정상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이 시기를 전후해 학창을 떠나거나 입학 못한 가난한 아동을 위한 야학이 본격적으로 지식청년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1928년 8월 원평동의 구미예수교회에서는 여름방학 기간동안 배움에 굶주린 무산아동을 위해 보름동안 매일 아침 8시부터 아동성경학교를 개강했다. 책임강사 송대헌(宋大憲), 김창호(金昌鎬), 이복순(李福順), 박홍련(朴蓮紅) 등이 가난한 아동을 많이 모집하여 무료로 정음(正音:조선어), 음악, 성경, 수공(手工), 유희(遊戲) 과목을 가르쳤다.
가뭄이 절정이던 1928년과 1929년에 각 면내에는 농촌마다 야학을 설립하고 돈이 없어 배움에 굶주리는 무산아동을 모아 매일 밤 열심히 교수했다. 과목은 조선어, 산술, 국어 등으로 보통학교 교과서에 준하여 가르쳤다. 1930년 2월 현재 중요한 야학을 보면 송정야학(교사 박경갑, 이종하 등), 형곡야학(교사 金秉驥), 부신야학(교사 金正洙 외 수명) 무이야학(교사 崔秉淵), 웅곡영신야학(교사 黃鳳云), 도개야학(교사 黃仲奎), 죽원야학(교사 미상), 옥성야학(교사 보통학교 교사 겸임), 동곡야학(교사 미상), 도중야학(교사 崔儀象), 덕촌야학(교사 미상) 등이다.
송정야학은 1929년 경찰서에서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중지시켜 1930년에 선산군에 다시 인가신청을 하고 수업하는데 경찰에서 다시 「서당취체규칙」을 들어 30인 이상은 교수할 수 없다하여 폐쇄당했다. 야학은 대책을 강구하고 다시 선산군에 인가원을 제출한 후 인가가 나올 때까지 부득이하게 각 교사들이 자택에서 생도를 나눠 가르쳤다.
도개면 도개동 黃重敎(25)는 면사무소에 취직해 동네의 돈 없고 연령초과로 취학치 못하거나 근처에는 교육기관이 없어 배움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무산아동 교육과 농촌문맹 퇴치를 목적하고 동네 유지들과 상의하여 1925년 3월 3일부터 도개야학원을 개설했다. 무산아동 수십 명을 모집하여 매일 3시간씩 갑을병 3반으로 나눠 무보수로 열심히 가르치자 부형과 동민들이 감동되어 야학교실까지 건축해 아동들의 성적도 동민들은 앞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1930년 3월 아동은 남녀 35명이고 야학원장은 김의용(金義用)이며 부원장은 야학공로자 황중교인데, 후일 도개공보교에 흡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야학은 물론 1930년에는 재외 유학생이 방학에 귀향해 7월부터 한글야학을 열어 아동교육을 한 사례도 많았다. 대구사범 특과생 문은암(文銀巖)은 구미면 자택에서 7월 23일부터 한글야학을 개설해 돈없어 못 배우는 아동 17명을 모아 가르쳤다. 경비는 자신이 담당하는데 청강생이 매일 밤 몰려왔지만 장소가 좁아 전부 수용하지 못할 정도였다.
옥성면 경성제1고보생 황만산은 방학을 이용해 주아동 자택에서 노동소년 50여 명을 모아 한글야학을 개설했다. 경비는 농우회에서 부담했다.
고아면 문성동의 대구고보생 김재철(金載轍)도 하계방학을 이용해 가난한 소년 50여명을 모집해 자택에서 한글야학을 개최하고 경비는 스스로 부담해 칭찬을 받았다.
선산읍 기독교회에서도 1930년 7월 29일부터 하계아동성경학교를 개설하고 소년소녀 50여 명을 모집하여 한글, 산술, 일어 등을 밤마다 가르쳤다. 강사는 심상린(沈相璘), 김선희(金善姬), 심상경(沈相瓊), 김귀아(金貴兒), 정선옥(鄭善玉) 등으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르쳐 우등상을 주며 격려했다. 우등수상자는 초등반 박정옥(朴貞玉), 보통반에 신대임(申大任), 이연기(李淵基), 박재덕(朴在德), 김옥희(金玉姬), 마정숙(馬貞淑) 등이었다.
1936년 해평면 월곡동 중견청년 최상현(崔相賢)은 동네 문맹아동을 위해 농진조합 사무소 내에 사설학술강습소를 설립하고 경비를 자담하며 주야로 문맹에 헤메는 동민으로 하여금 문자를 해득케 했다. 재학생은 70여 명이었다.
야학은 지식청년들이 가뭄으로 공교육에서 소외되어 배울 곳을 잃고 방황하는 가난한 아동들에게 문맹을 벗어나게 해 주려던 노력이었다.
그러나 1934년의 대홍수와 일제의 방해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1937년 황국신민서사가 발표되고 이듬해 조선어 상용금지 및 교육금지 정책, 1939년의 창씨개명 방침이 발표되기 전에 야학은 유지가 불가능했으리라 짐작된다.
|